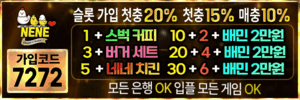36.5도의 무릎 베개
성지식
0
0
0
2019.11.25 09:20

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
언제였을까. 이젠 기억도 나지 않는 쓸쓸한 웃음. 사진첩을 뒤적거리고 나서야. 그 웃음을 찾아내고는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잃어버린. 아니 잊고 있었던 중요한 걸 다시 찾은 느낌? 하지만 그런 느낌마저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내쉰 한숨에 놀라고 있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과 따로 노는 마음에 두려움마저 들고 있었다.
"아직?"
약간은 자조적인 물음. 나에게 묻는 물음. 대답 같은 건 바라지도 않는다.
사람들은 보통 무릎베개라고 하면 여자들이 다소곳하게 무릎을 꿇고 앉은 채 누군가의 귀를 파주는 장면을 흔히 상상하고는 한다. 만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무릎을 베고 할 수 있는 하고, 많은 장면 중 왜 하필 귀지를 파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터인가 여자친구가 없는 남자들의 로망 같은 걸로 자리잡아 버린 것 같다. 아니, 실제로 해보면 별거 아니잖아.
애인이 생기면 한 번쯤 해보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손을 잡고 같이 걷는다 던지, 혼자 가기 무안했던 맛집에 같이 가는 일이라든지, 밤 늦게 귀가할 때 집까지 바래다 주기 같은 소소한 일들은 질릴 만큼 해봤어도 로망으로 상승한 무릎베개를 해준 적은 없었다. 글쎄. 왜 그랬을까.
가끔. 내가 피곤함에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보면 항상 내 머리를 받쳐주던 그녀의 무릎. 처음엔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지마는, 왠지 일어나기는 싫었다. 그녀가 나를 위해 준비해둔 배려. 아니 안식처처럼 느껴졌기에.
언제는. 내 머리가 너무 무겁다고 투덜댔었다. 그녀는 장난스레 말한 것이겠지만, 그 이후로는 내 스스로 목에 힘을 줘서 그녀에게 미안함을 표현했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말했다.
"괜찮아. 목에 핏대 세우면서까지 힘줄 필요는 없어."
귓가에 그녀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다소 낯간지럽기도 했지만, 그녀의 말은 언제나 달콤했다. 그리고 따뜻했다.
그녀는 몸이 유난히 차가웠다. 다소 열기가 있던 나와는 달리. 그래서 그녀는 여름을 싫어했다. 조금만 나갔다 와도 얼굴은 홍당무가 되고, 피부는 금세 익어버리고, 몸에는 물기가 가득했으니까. 그런 건 둘째치고서라도 진짜 여름이 싫었던 이유는 엉망진창인 내 몸을 보기가 싫어서였다. 내 등에 있는 큰 흉터를 만지작거리면서 그녀는 그런 말을 했다.
"정말. 네 몸이랑 내 몸이랑 딱 바뀌어야 되는 건데."
현실성 없는 말을 내뱉으며 내 굳어진 얼굴을 보고는 "농담이야"라는 말로 얼버무렸던 그녀. 항상 그런 식이었다. 내 얼굴을 보면 거기에 자연스레 따라오는 대답 같은 것. 아무리 농담이라도 그건 심했어. 혹 내가 또 뭐라고 잔소리를 할까 봐 그녀는 무릎베개를 만들고는 억지로 날 눕혔다.
36.5도의 베개에 누우면 그녀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치 흉터를 보듬어주는 것처럼. 내 몸에 남은 수많은 잔재를 만지작거리던 그녀의 습관 때문인지 손을 한시라도 가만히 두지 않았다. 손에 머리 냄새 밴다는 내 중얼거림은 가볍게 무시되었다. 그러곤 가끔 보이는 흰머리를 톡톡 뽑아대었다.
그렇게 한가하기만 했던 여름이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땐 아무도 몰랐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그러하듯, 그 사랑 속에 있을 때는 끝을 생각하지 못한다. 누구나 사랑에 빠지지만, 그 안에 오래도록 머물 수 없도록 사람을 만든 것은 창조주의 장난일지도. 그립다.
성지식 Hot Issue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