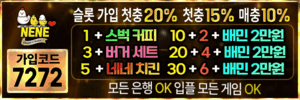그래서 안 했다네_by 성지식
성지식
0
0
0
2018.09.05 21:20
그래서 안 했다네
저녁 8시부터 같이 술을 마셨었다. 여자가 조금 더 취했다. 가끔 무릎이 꺾였다. 이럴 땐 바래다 주는 게 예의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새벽 1시에, 같이 들어간 다. 이렇게 될 줄 밤 10시경부터 짐작했었다.
여자가 잔을 비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무렵부터, 세 번째로 들른 술집이 어두운 와인바였을 때, 촛불 때문에 얼굴이 조금 더 예 뻐 보였을 때부터, 그래서 목소리를 깔았는데, 말하는 시간보다 가 만히 보고 있는 시간이 늘어났을 즈음이었다. 여자는, 굳이 취기를 감추지 않았었다.
“그만 집에 가요, 난 여기서 걸어갈게.”
“방금 넘어졌잖아요. 집까지 기어가게? 스타킹 다 나가요.”
“으응….”
이건 여자가 술기운을 못 이겨서 낸 신음 소리다. 여자의 무릎 은 택시에 오르기 전부터 풀려 있었다. 자꾸만 주저앉았다. 여자의 오른팔을 내 목에 두르고, 허리를 안아서 지탱했다. 여자는, 택시 안에서 정신을 놨다. 잠에 빠져들었다.
택시는 취한 여자를 바래다주기 위한‘젠틀’한 수단이지만, 한 겨울엔 꼭 그렇지도 않다. 찬바람에 가셨던 술기운이 택시에선 한 꺼번에 올라오니까. 가슴 언저리에 머물러 있던 알코올이 좌뇌 구 석구석까지 골고루 퍼지기 시작하는 건, 택시 뒷좌석에서부터다. 겨울엔 으레 이렇게 된다.
좌뇌가 논리와 이성을 담당한다는 건 중학교 때 배웠었다. 그 게 술에 마비되면 기댈 어깨를 찾게 된다. 이날은 무릎을 내줬었다. 후끈한 차내에, 여자가 뿌린 향수와 술 냄새가 달큰하게 퍼졌다. 굳 이 집까지 바래다주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가까운 모텔이 낫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될 때다. 매캐할 정도로 따뜻하게 덥혀진 한 밤의 서울 택시는 이런 식으로 젊은 남녀를 도와주기도 한다. 엔진소리 와 숨소리만 들렸다.
“으으음….
이건, 신발을 벗자마자 침대 위에 쓰러진 여자가 ‘그냥’낸 신 음 소리다. 익숙한 냄새에 안도했겠지…. 적어도 집에선, 애써 긴장 하지 않아도 괜찮다. 가까스로 집 안으로 들어왔으니,‘ 코트라도 벗겨 줘야지.’잠시 착한 마음을 먹었다. 문을 잠가줄 땐 이런 생각 을 했다.‘ 물이나 한 잔 마시고 가야지. 꼭, 가야지.’그러면서 눈으 론 몸을 훑었다.
여자는 누구나 입는 길이보다 조금 짧은, 촘촘하게 니트로 짠 검정 미니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어깨부터 허리, 엉덩이까지 선이 드러났다. 와인바에선, 목소리를 깔고 이렇게 물었었다.
“옷, 예쁘네? 어디서 샀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걸 집에서 고쳤어요. 자르고, 재봉질 하 고. 나, 원래 패션 디자인 전공이에요.”
줄인 건 치마 길이일까? 자리에 앉으면 허벅지를 4분의 1만 가 렸었다. 검정 팬티스타킹은 올이 나가 있었다. 아까 주저앉았을 때, 무릎이 아스팔트에 닿았었다.‘ 살이 까지지 않은 게 다행이야.’다 시 착한 생각을 하면서, 손은 종아리 위에 얹었다. 탄력 있게 섹시 하기보단 귀여운, 말랑하고 얇은 종아리다.
원래 패션 디자인 전공했다고, 미우치아 프라다 같은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라고 애기처럼 자랑했던 표정이 종아리 위에서 겹쳤다. 여자는, 쌕쌕거리면서 뒤척이기만 했었다. 여자의 숨소리가 고요했 고, 내 목에선 가끔 침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잠든 여자를 앞에 두고 내는 침 삼키는 소리는, 발정난 짐승처럼 천박하다고 생각하면서, 물 을 꺼내 마셨다. 눈으론 방을 훑었다.
김애란의 <침이 고인다>, <론리플래닛> 인도편, <보그> 10월호,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진중권의 <폭력과 상스러움>. 뭐라 정의 하기 어려운 취향이 책장에서 섞여 있었다. 컴퓨터 옆엔 DVD가 또 쌓 여 있었다. 각자 다른 친구한테 빌려온 것 같았다. 그래서 술도 소주, 맥주, 샴페인까지 섞어 마셨었나?
방은 생각보다 더 작았다. 책장은 좁은 원룸 벽에 바짝 붙어 있었 고, 침대는 책장과 또 바짝 붙어 있었다. 여자는, 취한 채 침대 위에 녹 아 붙어 있었다.‘ 10평 정도라더니, 좁긴 좁구나. 난 어쩔 수 없이 바 닥에선 잘 수 없겠구나, 어쩔 수 없이, 침대에서… 아, 코트를 벗겨야 지.’이럴 때 남자는 초대받은 손님도, 그렇다고 불청객도 아닌 모호 한 상태가 된다.
“으응….”
이 신음 소리는 여자가 돌아누우면서 낸, 전혀 음탕하지 않은 그 저 자연스러운 소리다. 코트 밑으로 손을 넣고 어깨부터 벗겼다.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까지 정신없이 잠들었을 땐 아무 리 쓰다듬고 핥아도 목석인 때가 있었다. 종종, 신음 소리는 그냥 살 아있다는 증거에 불과했었다.
남자와 여자, 술 이전에 섹스의 첫 번째 필요조건은‘생명’이다. 당연히, 둘 다 살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심장이 뛰고 피가 돌아도 반 응이 없으면 곤란하다. 섹스엔 소리와 냄새, 달라지는 몸짓이 흥이다. 네크로필리아necrophillia(사체애호증) 같은 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변태적인 세계라고 생각했다. 만취한 여자는 가끔 피부만 팽팽한 좀 비나 다름없을 때가 있으니까, 과장된 비유는 아니다.
지금 눈앞에 누워 있는 이 복잡한 취향의 여자는 점점 더 깊은 잠 에 빠져들고 있었다. 숨만 쉬고 있었다. 침대 밑에 앉아서, 여자를 흔 들어 깨웠다. 이 집을 나서든, 상상했던 밤을 보내든, 어쨌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게 우선이니까.
“일어나요, 나 이제 갈게.”
“응? 아… 미안해요. 나 너무 잠들었나봐. 어떡해?”
“응, 이제 갈게요.”
고마움인지 안타까움인지, 조금 일그러진 눈을 하곤 여자가 손을 뻗었다. 볼을 만지다, 내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얼굴이 가까워지 기 시작했을 때, 내가 키스했다.
“흐읍….”
아주 상식적인 신음 소리다. 이미 교환한 호감 위에서, 적절한 취기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남녀가 내는 소리니까. 침대 위로 올라가 여자를 안고 누웠을 땐, 노곤하게 피로가 몰려왔다. 입 속으론 혀가 밀려왔다. 택시에서부터 텁텁한 공기가 답답했었는데, 혀가 시원해서 상쾌해졌다. 여자의 혀 는 생각보다 작아서, 입술은 보기보다 얇아서 조심스러웠다. 여자의 오른쪽 허벅지는 내 왼쪽 골반 위에 걸쳐 있었고, 내 왼쪽 다리는 여자 의 두 다리 사이에서 움직였다.
‘서라벌 밝은 달밤에 밤늦게까지 노닐다가/들어와서야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더라/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 것인고.’ 여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면 넋 놓고 불렀을 신라 향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혀와 다리가 본격적으로 엉키기 시작했다. 손 은 검정 원피스 안에서 점점 위로 올라갔다. 배와 허리에서 머물던 왼 손으론 후크를 풀렀다. 침대 위에 덮여 있던 이불이 헝클어졌다. 아까 벗긴 코트가 방바닥에 널부러져 있었다.
“으음… 너무 어지러워요.”
혈기가 왕성했던 게 화근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마신 술이, 아직 가슴 언저리에 남아 있었던 게 원인이었다. 소 주와, 맥주와, 샴페인이 섞인 그녀와 나의 피가 다시금 머 리 곳곳을 헤집고 나왔다. 노곤하게 몰려왔던 피로가 이젠 몽롱해질 지경이었다. 여자의 숨소리가 둔해지기 시작했다. 몸짓은 사그라들 었다. 선택해야 했다.
여자의 발가락 끝부터 허리춤까지‘타이트’하게 감겨 있는 팬티 스타킹을 벗기고, 원피스를 올리고, 공들여 키스하고,‘ 더 어지럽게 해줄 수 있어요’느끼하게 속삭이면서 다시 달릴 건가. 아니면 이쯤 에서‘해프닝’으로 마무리할 건가.
“찢지 그랬니….”
결혼한 선배가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렇게까지 해놓고 그 냥 나온 네가 이상하다. 여자가 오히려 자존심 상했을지도 몰라. 끝까 지 안 할 거면 키스는 왜 했어?”키스했다고 섹스도 해야 한다는 논리 는 잘 모르겠지만, 이날의 정답이 키스에 있긴 했다.
시원했던 혀와 얇아서 조심스러웠던 입술이 둔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건 평온한 죽음 같은 침묵의 전조라고 생각했었다. 여자는 깊은 잠의 문턱에 있었으니까‘, 섹스 한 번 하겠다고’그 몸을 굳이 깨우고 싶진 않았다. 술기운에 떠밀려서 하는 건, 혹은 하게 하는 건‘아니함 만 못하니라’생각했었다. 네크로필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라니 까. 하지만 이런 게, 남자라면 절대 놓치지 않을 기회라는 거겠지. 다 음날 아침엔 무용담이 한 편 더 늘었단 걸 자축했겠지.
술에 떡이 된 여자와 한 번 했다고 자랑하는 남자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럴 땐‘했다’는 팩트만 중요해 보였으니까,“ 그래서 좋았 어?”물을 필요도 없었다. 호불호와는 관계없는 오입은, 항상 단순하 고 직설적이었다. 취향과 이야기가 관여할 여지는 없어 보였다. 하지 만 섹스도 엄연한 취향의 영역이 아니었나? 남자들이 하는 섹스 얘기 가 재미없는 덴 다 이유가 있다.
“으응….”
이건, 여자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신음 소리였다. 이불은 헝 클어진 그대로, 치마는 반쯤 올라간 채 여자는 잠들었다. 원피스 아래 로, 후크도 풀린 그대로다. 치마를 내리고, 어깨 아래로 이불을 덮어 줬다.‘ 내일 아침이 얼마나 민망할까’헛웃음만 나왔다. 선반 위엔 여 분의 열쇠가 놓여 있었다. 굳이 깨우지 않고도, 문을 잠그고 나갈 수 있게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성지식 Hot Issue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