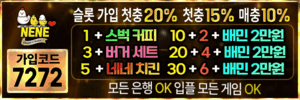섹스에도 재생버튼이 있다? 1
성지식
0
0
0
2020.02.06 09:20
섹스에도 재생버튼이 있다면 당신을 누를 것인가, 누르지 않을 것인가.

영화 <클릭>
버튼만 누르면 즉시 플레이 되는 장치가 존재한다면 당신은 누르지 않고 베기겠는가.
안 누르겠다고? 지조를 지키겠다고?
좋다. 어디 두고 보자. 준비가 되면 잠시 눈을 감고 되새겨 보라. 당신의 눈 앞에 그동안 갈망하고 원하던 이성이 있다. 플라토닉 러브든 피지컬 러브든 간에 당신이 원하고 꼴릿하던 대상이 바로 당신 앞에 있는 것이다. 단, 그는 로봇이다. 버튼만 누르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되새겨 보라. 하지 않겠는가? 하지 않겠다면 뭐, 이 글을 읽지 않아도 좋다.
필자는 25살이다. 인생사야 25년이지만 섹스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필자의 꼬추에 털이 나고 전립선에 수억마리 크리스탈이 뛰어 놀기 시작한 것이 중학교 1학년 무렵이니 섹스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것도 언 10년 쯤 된 것 같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필자의 첫경험도 그때 쯤이었다. 꼬추가 다 여물기도 전에, 상단 3센치 위 아마존에 아직 봄이 찾아 오기도 전에, 그렇게 뿌연 핑유를 보존하던 그 시절, 필자는 이미 새로운 역사의 첫 장 위로 토끼똥 냄새 풍기는 잉크를 흠뻑 적셨다.
상대는 피아노 과외 선생님 집 딸내미였는데... 그때 나이 17살 꽃다운 소녀 아니 누나였다.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에 하도록 하자. 여하튼 그 당시 필자의 첫경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랬다. 그것만이 내세상. 정말 어렸던 필자에게는 그것만이... 오직 섹스만이 내세상이었다. 뭐 정말 중요하지 않은 얘기니 그것도 패스하고.
그렇게 언 10여년이 흘렀다. 그리고 필자는 그 사이 무려 500명의 여자와 섹스를 했다. 5명도 아닌, 50명도 아닌, 무려 500명 말이다. 500명. 500명은 웬만한 학교의 한 학년의 수이자 조선 왕조가 건제한 연수이기도 하며 그만큼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이다. 아니라고? 당신이 지금까지 잠자리를 함께한 이성의 수를 헤어라 보라. 필자는 아직까지 나를 뛰어넘는 섹스마스터를 본 적이 없다. 잡소리는 집어 치우고 본론으로 들어가자.
과연 필자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여자들과 아니, 일개 여자 중대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었을까. 물론 필자가 그 당시 어떠한 메뉴얼을 가지고 여자들을 침대에 눕힐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꼬추가 헐대로 헐고 너덜너덜 해진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일종의 패턴이 존재했다. 그것이 바로 섹스! 재생버튼이다. 이 세상 그 누구든 자기만의 섹스 재생버튼을 가지고 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과연 어떤 버튼이 저 사람의 허리를 플레이 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필자도 모른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지닌 재생버튼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런 개인이 지닌 재생버튼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작동시키는지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 한다.
어렵다고? 말도 안 된다고? 밑져야 본전이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재생버튼만 재대로 찾을 수 있게 된다면, 재생버튼 하나로 당신의 침대에서 원하는 이성과의 섹스가 플레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가끔 여자들은 TV 리모콘으로도 작동한다.
14살 7월이었다. 꼬맹이 때부터 피아노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 필자는 어려서부터 피아노 과외를 받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만한 돈지랄이 또 없다. 뭐 물론 부모님 돈이니 내가 신경 쓸 건 아니지만 부모님 돈이 곧 내 돈이고 결국 뭐 나 뭔 말하니... 필자는 부모님을 사랑한다. 아무튼 뭐 평범하게 시작은 그 날도 역시 포근했던 7월 어느 날이라고 썰을 푸는 게 정석일 듯하지만 날씨까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
중요한 건 그 날 과외 선생님이 모임을 핑계로 1시간 늦게 보자고 했던 것. 하지만 순수했던 나는 너무나 고맙게도 제시간에 선생님 집으로 향했다. 그때야 뭐 꼬추가 다 여물지도 않았을 때라 야동은 짝짓기 영상이요 여자는 속옷 하나 더 입은 존재일 뿐이었으니 컴퓨터 앞에 앉아 손목 운동이나 하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더군다나 나홀로 집에 누워 빈둥거리기에는 너무나 따분한 오후였다.
항상 그랬듯 선생님 집 현관을 비번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섰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그곳에는 화장실 바닥을 때리는 물줄기 소리가 가득했다. 때마침 샤워를 마치고 나온 여인은 다름아닌 당시 17살이었던 선생님의 딸이었다. 평소 과외를 받을 때면 방에 들어가 나오질 않았던 통에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어서 굉장히 민망하고 서먹했건 것으로 당시를 기억한다.
누나가 냉장고에서 오렌지주스를 꺼내 내게 주는데 젖은 머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난생 처음 맡는 진한 샴푸 냄새 때문이었는지는 꼬추가 꼴릿했다!
성지식 Hot Issue
글이 없습니다.